제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분량 제한으로 지면에 모두 실리지 못했던 원문을 공유합니다.
의료 보험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세계 각국은 각자의 환경과 역사에 따라 발전한 특수한 의료 보험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처럼 공공과 민간의 의료 보험 다수가 공존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한국이나 영국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단 하나의 의료 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단일 의료 보험 체계의 장점은 많다.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 보험이므로 민간 보험사보다 안정적이다.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 하나의 보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여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신약이나 의료기기, 기술은 해당 국가에 도입될 여지가 매우 적어진다.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험이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오히려 기술 혁신의 성과를 환자들에게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의료 기술의 혁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에 대해 최근 세계 각국의 국영 의료 보험은 혁신적 의료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파격적으로 지불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미국의 보험청(CMS)에서는 작년 8월 혁신적인 의료기술에 파격적으로 메디케어 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MCIT (Medicare Coverage of Innovative Technology)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소위 “혁신의료기기 (Breakthrough Medical Device)”로 규정된 의료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FDA)의 인허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4년 동안 메디케어 보험을 미국 전역에 무조건 적용하겠다는 실로 파격적인 방안이다.
미국에서는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진단하기 위한 기술 중의 일부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이런 기기들은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해주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인 보험 적용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도 역시나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너무 과도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작년 중순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300개 이상의 혁신의료기기가 지정되었으며, 그 종류는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제 및 전자약 등 매우 다양하다. MCIT 정책 본격적인 시행 전에 현재 의견 청취 중이며, 당연하게도 산업계에서는 이를 환영하고 있다. 이 정책이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렇게 300개가 넘는 다양한 혁신의료기기의 미국 내 시장 진출에 활로가 열릴 것이다.
독일은 더 과감하다. 2019년 ‘디지털 헬스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작년부터 DiGA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앱이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만 하면, 무조건 임시 수가를 최소 12개월, 최장 24개월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임시수가를 바탕으로 근거를 창출하여, 해당 기간 이후에는 수가를 재산정한다. 이 정책의 시행에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을 선도하지 못하는 독일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이미 10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앱이 수가를 받기 시작했다. 디지털 치료제가 주를 이루며, 적응증은 당뇨, 우울증, 불면증, 편두통, 이명 등 다양하다. 특히 이 제도에서는 수가를 개발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116유로에서 743유로까지 폭넓게 책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어떠할까? 한국에서도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 규제 개선책이 나왔지만 핵심인 지불 구조의 개선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단일 보험 체계에서 지불 구조의 개선 없이는, 다른 모든 진흥책은 그저 미봉책일 뿐이다. 미국처럼 한국에도 ‘혁신의료기기’, ’혁신의료기술’ 등의 지정 제도가 있지만, 모두 수가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산업 진흥이나 기술 개발의 동기 부여에도 아무런 실효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60개가 넘는 인공지능은 (이중 일부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되어 있다) 수가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비슷한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본질은 결국 지불 구조다. 한국에서 이 논의는 수년째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의료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지불 구조의 혁신 외에는 답은 없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회피한다면 공회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당국에서는 그동안 해외에도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선례도 생겼으며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제는 변화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선례도 있다. 변화하려 한다면, 지금이 적기이다.
Discover more from 최윤섭의 디지털 헬스케어
Subscribe to get the latest posts sent to your em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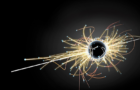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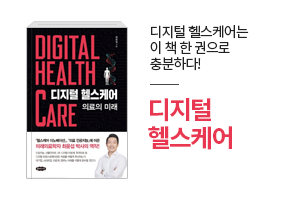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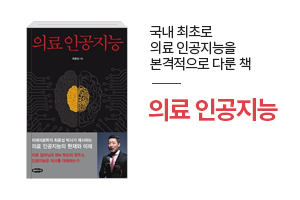





좋은 글 감사합니다~!!